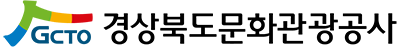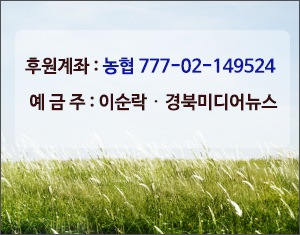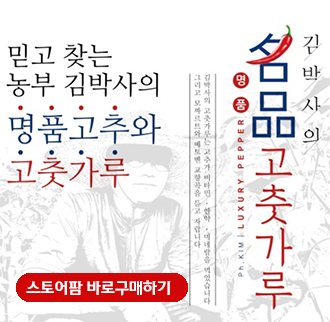불원재 유교문화 해설 79 (송암 권호문 관물당, 독락팔곡 5~7장 독송)
○ 관물(觀物)이란 고요한 가운데 만물에 내재된 이치를 관조한다는 뜻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주관적이 아니라 자연의 이(理)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송나라 유학자 소옹(邵雍)이 말하기를 “관물의 즐거움으로 말하면 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비록 사생(死生) 과 영욕(榮辱)이 눈앞에 전개되면서 싸움을 벌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이 그 속에 개입되지만 않는다면,
사시에 따라 바람과 꽃과 눈과 달이 우리의 눈앞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何異四時風花雪月, 一過乎眼也)”라고 하였고 그가 지은《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를 《관물내편(觀物內篇)》 이라고 하였다.
고려중기 문신 이인로(李仁老, 1152~1220)는 《파한집(破閑集)》에서 말하기를 “뿔 있는 짐승은 윗니가 없다. 날개가 있으면 다리는 두 개뿐이다. 꽃이 좋으면 열매가 시원찮다. 사람도 다를 게 없다. 재주가 뛰어나면 공명은 떠나가서 함께하지 않는다."
또 조선조 태촌 고상안(高尙顔, 1553~1623)은 "소는 윗니 없고 범은 뿔이 없거니, 천도 (天道)는 공평하여 부여함이 마땅토다. 이로써 벼슬길의 오르내림 살펴보니, 승진했다 기뻐말고 쫓겨났다 슬퍼말라.
(牛無上齒虎無角 天道均齊付與宜 因觀宦路升沈事 陟未皆歡黜未悲) 뛰어난 재주로 명성과 공명을 함께 누리려 드는 것은 뿔 달린 범과 같다. 기다리는 것은 재앙뿐이니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사물 속에 무궁한 이치가 담겨 있다. 듣고도 못 듣고, 보고도 못 보는 뜻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옛 사람들은 관물(觀物)이라고 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을 넘어 이치로 읽을 것을 주문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말로 송암 권호문은 서재의 당호를 퇴계의 뜻에 따라 '관물당'이라 했다.
○ 관물당 기문〔觀物堂記〕
--송암 권호문--
나는 서재 이름을 ‘관아재(觀我齋)’라고 하고 마루 이름을 ‘집경당(集競堂)’이라 하였다. 그런데 퇴계 선생께서 ‘관물(觀物)’로 바꿔 주시어 그대로 이름으로 삼게 되었다.
아! 관물(觀物)의 뜻은 크다.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이 온갖 종류의 사물일 뿐이다. 사물은 스스로 사물이 되지 못하고 천지가 낳아서 생긴 것이고, 천지는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고 사물의 이치가 생성시킨 것이다.
이에 이치가 천지의 근본이고 천지가 만물의 근본임을 알아 천지로 만물을 보면 만물은 각각 하나의 사물이고, 이치로써 천지를 보면 천지 또한 하나의 사물이다.
사람이 천지만물을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가 됨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살피지 못하고 그 유래에 대하여 어둡다면 박학하고 단아한 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 마루에서 보는 바가 어찌 다만 외물(外物)에 눈길을 빼앗기고 연구하는 실질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한가로이 지내며 두루 바라보면 물이 흐르고, 산이 우뚝하고,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놀고,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오가고(天光雲影), 맑은 바람에 갠 달이 떠오른다.(光風霽月)
나는 새와 물속의 물고기와 동식물과 초목과 화훼들이 형형색색으로 제각기 그 천진(天眞)을 얻었으니, 하나의 사물을 살펴보면 한 가지 사물의 이치가 있고, 만 가지 사물을 살펴보면 만 가지 사물의 이치가 있다.
하나의 근본에서 나와 만 갈래로 나뉘고, 만 갈래를 미루어 하나의 근본에 이르게 되니 만물이 유행하는 오묘함이 어찌 그리 지극한가. 이 때문에 사물을 보는 자가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만 못하고, 마음으로 보는 것은 이치로 보는 것만 못하다. 만약 이치로써 관찰할 수 있으면 만물을 훤히 통찰하는 것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질 것이다.
소옹(邵雍)이 “사람이 천지만물의 도(道)를 알 수 있으면 사람에 대하여 극진할 수 있는 것이다.(人能知天地萬物之道,所以盡乎人.)”라고 하였고, 증자(曾子)는 “앎에 이르는 것은 사물을 궁구하는 데 있다.(致知在格物)”라고 하였다. 실로 이 마루에 거처하며 격물치지의 공부에 힘을 쏟아 사람에게 극진하게 하는 도를 얻는다면 ‘관물(觀物)’이라는 이름의 뜻을 거의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신미년(1571) 6월 보름에 송사소은(松舍小隱)이 쓰다.
○ 송암 권호문 선생 독락팔곡(5~7장 계속)
제5장
집은 范萊蕪의 蓬蒿ㅣ오 길은 蔣元卿의 花竹이로다./집은 곤궁하게 살아도 태연자약 했던 한나라 법래무의 초옥이요, 길은 전한의 장원경과 같이 화죽으로 길을 열고, 뜻이 맞는 친구와 함께 하고자 하니.
百年浮生 이러타 엇다 하리!
/뜬구름 같은 인생이 이러한들 어떠하리
진실로 隱居求志하고 長往不返하면/진실로 묻혀살며 뜻을 구하다가, 오래동안 속세를 떠나 돌아오지 않게되면
軒冕이 泥塗ㅣ오 鼎鍾이 塵土ㅣ라./관료의 화려한 수레와 옷이 수렁에 빠짐이요, 당시에 명예가 후세에 티끌과 같네
千磨霜刃인들 이 뜻들 긋찰리랴/천 번 갈은 예리한 칼날인들 이 뜻을 그칠 것인가!
韓昌黎 三上書는 내의 뜻데 區區하고/당나라 문인 한유가 벼슬을 구하여 세 번 올린 편지는 나의 뜻에 구차하고
杜子美 三大賦ㅣ 내 둉내 行道하랴/ 당나라 시인 두보가 삼대부를 올려 벼슬을 기다리던 것을 내가 끝내 행할 것인가!
두어라 彼以爵 我以義 不願人之文繡하야/두어라 저들은 벼슬을 구하고자 하고, 나는 의리를 행하여 남의 비단옷을 원치 않으면서
世間萬事 都付天命 景 긔 엇다 하니잇고!/세간만사를 모두 하늘의 뜻에 맡기니, 그 광경이 어떠합니까!
제6장
君門 深九重하고 草澤 隔萬里하니/임금님은 깊은 구중궁궐에 계셔서, 나의 궁벽한 집과는 만 리나 떨어져 있으니
十載心事를 어이 하야 上達하료/오랫동안 품은 뜻을 어떻게 아뢰리오
數封奇策이 草하얀 디 오래거다./몇 가지 다듬어 둔 계책, 초안한 지 오래로다
致君澤民은 내의 才分 아니런가/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은택을 베푸는 것은 내가 배운 본분이 아니던가
窮經 學道를 뜻 두고 이리 하랴/경서를 궁구하고 도를 행함에 뜻을 두고 이러 하랴!
찰하리 藏修丘壑 遯世無悶하야/차라리 한적한 산속에서 몸을 닦고 학문에 전념하며 세상을 등져 살아도 근심함이 없으니
날 조찬 번님네 뫼옵고 綠籤山窓의/나를 따르는 벗님네를 모시옵고 산속 초옥에서 책을 읽으며
共把遺經 究終始 景 긔 엇다 하니잇고/ 성현의 경전 함께 부여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궁구하는 그 광경이 어떠합니까!
제7장
一屛一榻에 左箴右銘이라 【再唱】/병풍 하나와 서상 하나인데, 왼쪽에 잠언이요 오른쪽에 경계명이라
神目如電이라 暗室을 欺心하며/신명은 번개처럼 잘 보니 어두운 방이라고 양심을 속일소냐
天聽如雷라 私語인들 妄發 하랴/하늘은 속삭이는 말도 우레처럼 잘 들으니, 사사로이 하는 말이라도 함부로 하랴
戒愼恐懼를 隱微間애 닛디 마새/군자는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 하는 것은, 은미한 것이 더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
坐如尸 儼若思 終日乾乾 夕惕若하는 뜻은/시동처럼 묵묵히 앉아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종일토록 힘써 노력하고 저녁에도 잘못됨이 없을까 두려워 하는 뜻은
尊事天君하고 攘除外累하야/매사에 정성스런 마음으로 공경하고, 세속의 허물을 떨쳐 없게 하여
百體從令 五常不斁하야/온몸이 나의 태연한 마음을 받아들여, 사람의 도리를 싫어함이 없이하여
治平事業을 다 이루려 하엿더니/치국평천하의 사업을 모두 이루려고 하였더니
時也命也인디 迄無成功 歲不我與하니/시운인지 운명인지 끝내 이루지 못하고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니
白首林泉의 하올 일이 다시 업다/나이들고 시골에서 할 일이 다시 없다
우읍다 山之南 水之北애 斂藏蹤跡하야/슬프도다, 산의 남쪽 물의 북쪽에 발자취 감추고
百年閒老 景 긔 엇다 하니잇고/한평생 한가하게 늙어가는 그 광경이 어떠합니까!
※ '독락팔곡'이라 되어 있으나 문집에는 7장만 실려 있다. (불원 해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